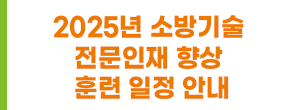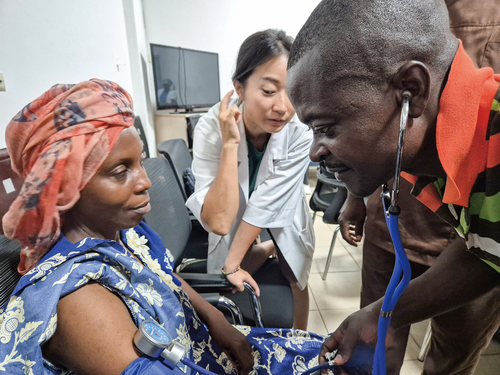필자는 지난해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화재 현장을 경험했다. 당시 화재진압 후 농연이 걷힌 복도에서 다시 환하게 모습을 드러낸 피난구 유도등을 보며 그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깊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도등 설치 기준은 NFPA(미국화재예방협회)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피난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NFPA 101(인명안전기준)에서는 피난구 유도등을 대형 공간에서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2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의 흐름을 고려한 기준이다.
반면 우리나라 NFPC 303(유도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는 유도등 설치 높이를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난 가시성과 내구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은 먼저 천장 부근에 모이고 천장을 따라 확산하는 ‘천장제트흐름(Ceiling Jet Flow)’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연기층은 실내 층고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며 일반적인 건축물의 층고 3m를 기준으로 하면 연기층은 약 30㎝ 두께로 형성된다. 스프링클러 헤드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등은 이러한 연기층 내부에 있어야 하고 피난구 유도등은 그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유도등의 설치 높이가 문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기에 의한 가시성의 문제다.
피난구 유도등이 연기층 내에 위치하면 연기에 의해 불빛이 차단돼 피난하는 사람들이 이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
둘째, 열 손상 가능성이다.
연기층은 고온을 유지하며 이로 인해 유도등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난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도등을 보며 방향을 확인해야 하는데 열에 의해 유도등이 기능을 상실하면 피난이 더욱 어려워진다.
셋째, 층고가 높은 공간에서의 시인성 문제다.
층고가 높은 대형 공간에서는 피난구 인근에서도 유도등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난구 유도등 설치 기준을 개선해 유도등의 설치 높이를 2m 이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는 NFPA 101의 기준과도 일치하며 피난 시 연기층 아래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형마트 등 공간에 대해서는 NFPA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형 공간의 경우 설계자의 재량을 인정해 층고에 따라 유도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피난은 연기를 회피해야 하고 소화는 연기를 배출해야 한다. 이는 모든 화재에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유도등 설치 기준은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피난 환경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
현업 부서를 떠나 그때를 돌아보니 자그마한 변화라도 현장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
향후 유도등 설치 기준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
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재훈 소방령 (소방기술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