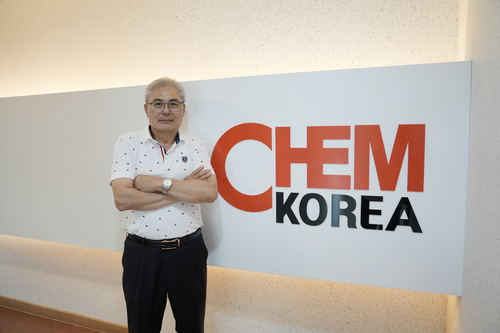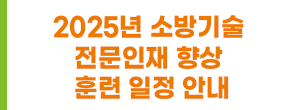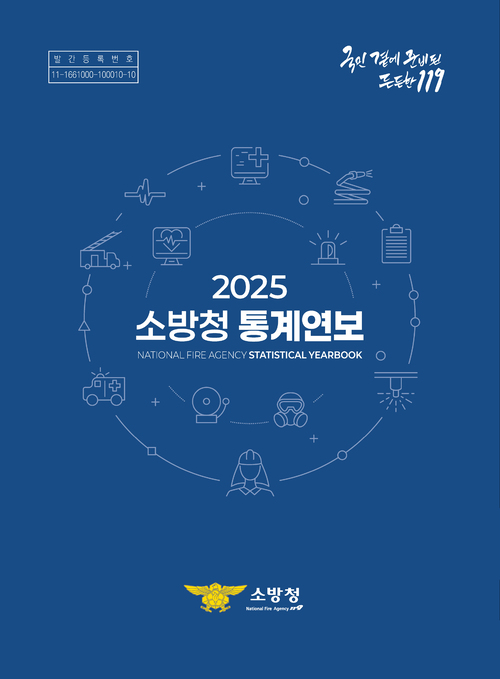|
구급 지휘차(EMS Command Unit)와 다수 사상자 대응 차량(MCI Response Unit) 현재 ‘다수 사상 재난 119구급대응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임시의료소장은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정의하고 있다.
① 선착대 구급대원 중 출동대의 선임구급대원(최선임자) 또는 주 처치자 ② 간호사, 1ㆍ2급 응급구조사 ③ 구조ㆍ구급센터장(구급대장) ④ 기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정한 자
하지만 선착 구급대의 주 처치자가 경력 2~3년 정도의 소방사라면 과연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한 재난 사고에서 임시의료소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범죄 현장에서 순경이 현장을 지휘하거나 화재 현장에서 소방사 또는 소방교가 현장 지휘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다.
2020년 부산 금정소방서의 연구 논문 설문조사를 보면 구급대원들은 구급대응 지휘체계에 불만족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수 사상자 대응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서 94명(66.7%)이 구급 전문 지휘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외 자유 서술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다.
▲ [표 1] 부산 금정소방서 다수 사상 현장 MCI unit(구급 선제 대응팀) 도입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재고 연구논문 중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대형 재난, 다수 사상자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을 지휘할 구급대장과 구급 지휘차가 필수다. 하지만 규모가 큰 다수 사상자 현장일수록 구급 지휘 공백이 매우 길게 발생하며 구급 지휘차의 유무가 현장 대응에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화재 현장 초기에 압도적인 소방력을 투입해 화세가 커지는 걸 방지하는 것처럼 다수 사상자 현장에서도 빠른 구급 지휘체계를 투입해야 원활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 한국에서 발생한 다수 사상자 사고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된다.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에서는 환자 분류를 하지 않고 초기 구조 인원 69명 중 40명을 울산시티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리고 울산 좋은21세기병원으로 26명을 이송했는데 안타깝게 이송된 인원 중 7명이 사망했다. DMAT 출동 결정에만 70분이 소요됐으며 사고 발생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현장 응급의료소가 설치됐다.
2014년 고양 버스터미널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는 9명이 사망하고 1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도착한 구급대가 현장 도착 2분 만에 환자 7명을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도 현장에서 환자를 분류하지 않고 바로 이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현장 응급의료소장이 도착하고 DMAT 역시 비슷한 시각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의 고질적인 다수 사상자 현장 대응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는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선착구급대를 비롯해 현장에 먼저 도착한 3대의 구급차가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촌극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현장 임시 응급의료소가 가동되지 않았고 환자 분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의 36.4%가 이송되는 문제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대형 재난이나 사고 이전에도 대한민국 소방은 다수 사상자 훈련을 지속해서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이태원 사고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이쯤 되면 우리 소방의 다수 사상자 훈련이나 매뉴얼이 과연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며 효과적인지, 선착 구급대에 의한 다수 사상자 대응만으로도 현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문제는 구급 지휘 시스템이 없고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그중 가장 우선 도입돼야 하는 건 구급 지휘차와 경험이 많은 구급대장 배치다.
구급 지휘차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다수 사상자 현장의 구급 지휘, 1차 중증도 분류 ② 구급대원의 현장 지휘ㆍ안전 관리 ③ 구급상황센터, 상황실, 병원, 소방 지휘부와의 통신(MedCOM) ④ 이송 병원 지정/2차 중증도 분류 ⑤ DMAT, 현장 응급의료소 인력과 협업 ⑥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후 보건소장에게 현장 상황 인계 등
예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구급 지휘차량을 배치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SUV나 버스, 트레일러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한국에서 버스 형태의 구급 지휘차는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고 현재 소방청에서 계획 중인 중형 승합형 구급 지휘차(현대 쏠라티)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기동성을 극대화한 SUV 형태의 구급 지휘차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수 사상자 지원 차량(MCI Support Unit/MCI Supply Unit) 구급 지휘차량은 소방기관 상황이나 지역 환경에 따라 다수 사상자 대응차량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Multi-Role) 차량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급 지휘차량에는 적재할 수 있는 장비의 한계가 있고 탑승 인원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구급 지휘차량만으로는 대형 재난이나 레벨3 이상의 대량 사상자 현장에 대응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다수 사상자 현장에서는 산소나 들것, 담요, 지혈대, 응급처치 장비 등 물품 부족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재난 규모가 크거나 환자가 많으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곤 한다.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 사상자 지원 차량(MCI Support Unit)을 운용하기도 한다. 트레일러나 버스, 트럭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현장은 폭설이 내리는 영하의 날씨였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영하 11℃, 체감기온 영하 17℃ 혹한이었으나 현장 응급의료소에는 환자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난방시설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1)
2009년 9월 16일 경주에서는 고속버스가 30m 낭떠러지로 추락해 17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119구급차가 담요를 하나도 가져오지 않아 환자들이 알몸으로 구급차를 기다려 유족들이 항의하는 모습이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구급차 적재 기준에 따라 담요를 2개 이상 적재하라는 공문이 시달되기도 했다.
이처럼 환자 응급처치의 가장 기본 요소 중 하나가 체온 유지다. 하지만 담요나 외부 가온을 위한 장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특수 구급차에 이런 장비들을 모두 적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수 사상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다수 사상자 지원 차량이 꼭 필요하다.
다수 사상자 이송 차량(Multi Patient Vehicle)/구급버스(AMBUS)
일본 도쿄 소방국의 슈퍼 앰뷸런스는 6명의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침대 형태로 제작돼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 상황에 맞게 적절한 형태의 구급버스를 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구급버스는 이미 부산ㆍ제주소방 등에 배치돼 화재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사고 시 다수환자 이송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부산에도 구급버스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엔 활용 빈도가 다소 낮았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에 요긴하게 사용됐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단순 연기 흡입 환자를 특수 구급차가 계속 이송해야 하는데 구급버스를 활용하면 산소 투여 등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고 귀가시키거나 후착 구급대가 올 때까지 구급버스 내부에서 대기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구급 지휘차나 다수 사상자 대응차량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구급버스를 임시 응급의료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폭우나 폭설, 한파 같은 악천후 상황에서는 환자를 외부에 집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구급버스의 활용도는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1) 2019년 대한응급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밀양화재 백서 중
부산 해운대소방서_ 이재현 : taiji3833@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7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