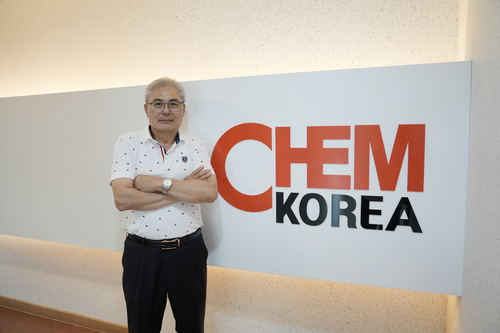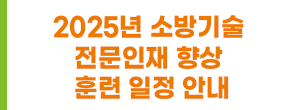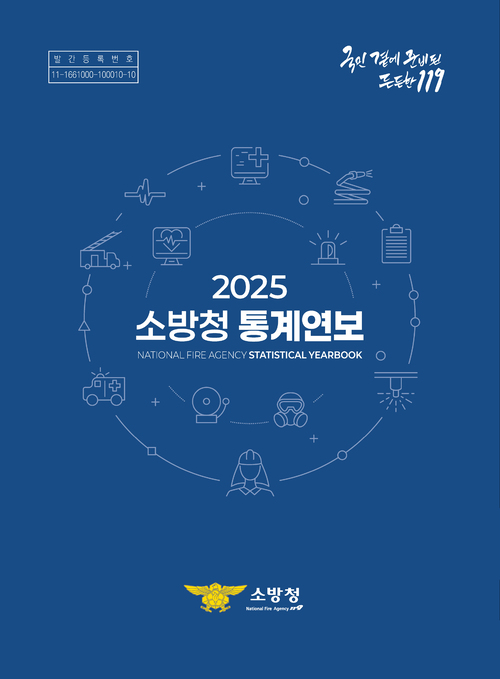|
중환자 구급차(MoICU/Mobile ICU)/Critical Care Ambulance 중환자 구급차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도 배치되는 차량이다. 소방청은 소방서마다 중형 중환자 구급차를 1대씩 배치하려고 계획 중이다. 하지만 현재는 중환자만을 위한 구급차라기보단 일반적인 출동도 병행하고 있어 그 의미가 약간은 퇴색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내과 중증환자와 중증 외상 환자 대응을 위해 전문 구급센터에 꼭 배치돼야 할 차량이다. 소방청에서는 중증환자의 병원 간 이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향후 중환자 이송 건수도 증가할 거로 예상돼 중요성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서는 주로 병원이나 민간 구급업체에서 중환자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크리티컬 케어 앰뷸런스(Critical Care Ambulance) 등으로 운용 중이다. 중환자 구급차에는 중증환자 응급처치와 이송을 위한 교육ㆍ인증을 받은 AEMT-CC1), Paramedic-CC, CCN(Critical Care Nurse) 등의 전문인력이 탑승한다.
음압 구급차 2003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2019년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2000년대에 들어 다양한 감염성 질환이 유행했고 이는 대한민국 소방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전염성 질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거로 예상한다.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중형 음압 구급차를 배치하고 있다. 음압 구급차 역시 전문 구급센터에 배치돼야 할 차량이다.
전문 구급센터에는 감염병 대응 물품의 대량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감염성 질환의 유행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회적 구급차(Social Ambulance), 정신건강 구급차(mental health ambulance) 한국은 고령화 사회2)로 진입한 지 이미 7년이 지났다. 2022년 기준 65세 인구가 900만명을 넘어서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까진 6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2022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이송 인원 182만3819명 중 60대 이상 환자가 91만2404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일본 소방청 소방백서를 보면 65세 이상 환자 이송은 헤이세이 21년(2009년) 468만2991명에서 레이와 원년(2019년) 597만8008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다. 이송 환자의 60%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도 이송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 소방청에서는 2035년을 기준으로 구급 출동 건수는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노인 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구급 출동 건수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역시 이송 건수는 줄지 않을 거로 예측된다.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1950년 초반부터 1960년대 초반 출생인구를 의미하는데 714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한다.
이들은 현재도 구급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구급 출동에 많은 부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가 심해지고 독거노인 등 1인 세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3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과 질환자 등 병원이나 행정기관에서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119구급대가 모든 걸 처리해야 하고 이송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는 소방 구급대의 출동과 이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호자가 없어 환자를 받지 않거나 환자가 거동이 되지 않아 귀가에 문제가 있어 수용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 구급대의 병원 선정에 애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구급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나 정신과 전문간호사 등이 구급차에 탑승해 정신병원 또는 시설 입소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문 구급센터에 사회적 구급차가 배치되면 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하기 위한 비응급 상황이나 노숙자의 시설 이송을 위해 특수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동 건수 저감, 구급 공백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소아 구급차 + 임산부 구급차 = 가족 친화적 구급차(Family Friendly Ambulance) 이미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인구 절벽 시대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구 절벽이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아 환자 한 명, 한 명이 매우 중요한 환자가 될 거란 의미지만 소방은 소아 환자 대응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구급차 필수 보유 장비 중 소아 외상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는 없다. 소아 전문 기도관리 장비도 적재하지 않은 구급차가 많다. <119플러스> 2022년 3, 4월호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6월호 ‘소아 고정장비 Ferno PEDI-PAC®’에서 언급했듯이 소아 환자를 위한 장비나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간 소아 환자 기도관리 교육이나 소아 외상환자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본 구급대원은 얼마나 있을까?
119구급대원의 입장에선 소아 심정지나 소아 중증 외상 환자를 접할 일이 적다 보니 경험을 쌓거나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아 환자가 줄어들수록 이는 점점 심해지고 119구급대원의 소아 중증환자 대응 능력은 점차 저하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출산율 감소를 겪은 일본은 일찍이 소아 구급차를 도입했다. 미국은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산부인과 전문간호사와 파라메딕이 탑승하는 소아 전문구급차를 운용 중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등을 구급차 내외부에 부착하거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으로 구급차 디자인을 한다.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국민에게 구급 서비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은 점점 줄고 있다. 이에 따라 분만이 가능하거나 산과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지역이 늘고 있다.
얼마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과 폐과를 선언했다. 폐과 선언과는 별개로 소아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점차 줄어 지방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도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 야간에 소아 환자를 아예 받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시작됐다.
앞으로 산부인과 응급환자나 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 내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선 소아 환자와 산부인과 응급환자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구급차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소방의 상황에서 임산부 구급차나 소아 구급차를 별개로 운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아/임산부 응급상황 대응이 동시에 가능한 ‘가족 친화적 구급차(Family Friendly Ambulance)’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는 이제 시작됐다. 소방에서는 ‘아이가 안전한 도시 부산’ 같은 슬로건이 필요하다. 또 이에 맞는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가족 친화적 구급차 역시 전문 구급센터에 배치돼야 한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선 조산사와 산부인과 전문간호사의 채용도 필요할 거다.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기존 구급대원들의 전문성이 동시에 올라갈 거로 기대된다.
부산 엑스포 대비를 위한 전문 구급센터 ‘10년을 앞서가며’
앞으로 소방 조직과 구급 전문성 향상, 업무 저변 확대를 위해선 단순히 구급차만 늘리고 구급대원만 충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방 구급의 역할을 ‘응급상황’에만 국한하기에 국민의 눈높이는 이미 높아져 버렸다.
구급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구급 시스템과 구급 차량을 도입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섬세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맞게 소방에서도 그에 맞는 정책과 구급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 시작은 구급전문센터가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유행과 기후 재난, 테러, 대형 사건ㆍ사고에서 소방이 구급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응하기 위해선 견고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흩어진 다수 사상자 대응 차량과 장비, 인적자원을 한데 모아 구급 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십 년 이상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많은 소방위나 소방경이 구급 지휘차를 타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을 지휘하는 소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구급대원들이 치열하게 업무연찬을 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소방. 모든 구급대원이 전문 구급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소방이 되는 날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40, 50대 구급대원의 경험은 전문 구급센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들을 특수 구급차에 태워 하루에 10여 건 이상 출동을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구급지휘차나 다수 사상자 대응 차량, 중환자 구급차 등에 탑승시키면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출동 빈도를 낮춰 체력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 화재나 다수 사상자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은 구급 지휘차의 지휘를 받으며 환자를 분류ㆍ처치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빨리, 빨리!”, “무조건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게 되고 화재 구조 지휘관도 화재나 구조 지휘에 집중할 수 있어 현장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필자가 근무하는 부산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 개최 가능성도 매우 큰 거로 예상되는데 이를 계기 삼아 엑스포를 유치하는 권역에 전문 구급센터가 신설되길 희망해 본다. 엑스포가 개최되면 6개월간 200개국에서 5천만여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센터에 개별적으로 분산 배치된 특수 구급차와 본서, 본부에 분산 배치된 재난대응 자원ㆍ시스템으로는 엑스포 같은 대형 행사에 완벽하게 대응하기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구급 지휘차와 다수 사상자 대응 차량, 다수 사상자 지원차량, 중환자 구급차, 음압 구급차, 가족 친화적 구급차, 사회적 구급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특수 구급차가 한곳에 모여 있는 전문 구급센터가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의견이 10년을 앞서가는 생각이길 바라며 긴 글을 마친다. 1) 미국은 지역마다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구급대원 인증제도를 운용하기도 한다. 2) UN 국제연합 기준 인구의 7% 이상이 고령자(65세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한다.
부산 해운대소방서_ 이재현 : taiji3833@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8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