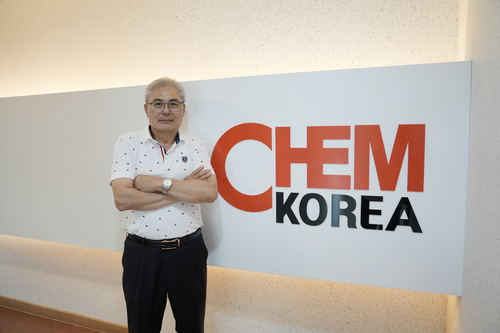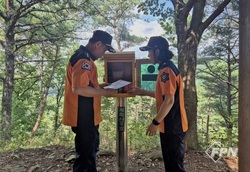|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독일의 유명 컨설팅 기관인 롤랜드버거는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가 올해 $550억(약 72조원)에서 2030년에는 $3250억(약 427조원)으로 6배 가까이 급성장할 거로 전망한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생활거점과 이동거점, 물류거점 등을 중심으로 충전시설을 집중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런 성장 가도 속에서 화재ㆍ폭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대부분은 충전 중 발화하면서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전기 충전설비에서 화재ㆍ폭발이 발생했다. 전기 충전기기와 연결된 배전 쪽에서 발생한 불꽃이 점화원이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충전 중이던 아이오닉 전기차에서 불이 나 4시간 동안 끄지 못했다.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폭발 사고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장에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또는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거나 축소해 자연스레 잊히는 사고로 남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관련 규정도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성이 높은 충전기를 환기율이 낮은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늘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엔 급속 충전기 설치도 많아져 화재ㆍ폭발 위험성은 더 커질 거로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전기차 충전설비의 환기에 관한 해외 규정들을 소개하고 국제방폭자격자(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인증의 국제방폭자격)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 관련 국제 규정들 대표적으로 유럽의 FPA1)에서 발간한 ‘Recommendations For Fire Safety When Charging Electric Vehicles(Version 2, 이하 RC59)’, APEA2)와 EI3)의 ‘Design, Construction, Modification,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of Filling Stations(4th Edition, 이하 Blue Book4))’, 그리고 미국 ‘NFPA 70’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시된 각 규정을 하나씩 소개하겠다.
1. 충전설비 RC59 version 2(2023)의 3.3.5 에서는 ‘발화성 액체 저장고와 같은 위험 설비가 있는 경우 EV 충전 지점은 ‘위험 구역(ATEX 기준 Zone 1 또는 2)’의 가장자리에서 최소 10m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최소 이격거리는 길이가 5m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 전체 길이에 5m를 더한 것과 동일하게 확장돼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다음으로는 2020년에 IET5)와 APEA가 공동으로 제작한 Electric Vehicle Charging Installations at Filling Stations의 규정을 보도록 하자. 1.5절의 Hazardous areas에서는 ‘주유소의 위험 지역은 Blue Book의 3장(Hazardous area classification)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추가 정보는 해당 간행물의 9장에 나와 있다’고 명시돼 있다.
Blue Book의 3.3.9.4절(고정 장비 설치 시 고려해야 할 복합 위험 지역)에서는 ‘진공 청소 장비의 호스와 전기자동차 충전 장치용 케이블이 폭발위험장소 구역에 닿아선 안 된다’고 담고 있다.
9.5.11절(충전기기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 별도의 전력회사 공급 케이블이 제공되는 경우 전력회사 공급 케이블은 위험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유소 앞마당을 가로지르거나 둥글게 배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충전기기를 폭발위험장소 외 범위에 설치하더라도 전원공급 케이블이나 인터페이스들 또한 폭발위험장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NFPA70(2020) 511.10절의 (B)에서는 ‘모든 전기 장비와 배선은 511.10(B)(2)ㆍ(B)(3)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625조(Electric Vehicle Power Transfer System)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 511.3에 정의된 클래스 I 위치 내에 커넥터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514.3절에서는 주유 디스펜서와 인접한 곳에 구분된 장소를 표시하고 디스펜서로부터 6m 떨어진 거리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국내에는 충전 인터페이스의 폭발위험장소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3.6.29.)에는 인터페이스 구성 부품에 관한 기준만 명시돼 있다.
‘충전기기를 폭발위험장소 외에 설치하더라도 충전용 인터페이스(커넥터, 케이블 등)는 폭발위험장소 범위에 절대 닿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
또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들은 충전 중에 커넥터와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스파크나 정전기 등으로 인한 잠재적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환기(Ventilation) RC59(version 2(2023))의 3.3.7절에는 ‘충전 장소를 지하실에 둘 경우 스프링클러 시스템과 환기장치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뒤쪽 Checklist의 5.3.4절에는 ‘지하 충전 구역은 스프링클러 시스템과 환기장치 설계를 신중하게 고려해 최소 120분 내화성을 제공하는 구조 요소로 건물의 다른 부분과 분리돼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또 Electric Vehicle Charging Installations at Filling Stations의 Checklist 4.6 항목에서는 충전 장비 주변에 환기와 냉각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있는지 확인하게 돼 있다.
미국 NFPA 70의 625.52절(B)에는 ‘실내 충전을 위해 환기가 필요한 전기자동차 충전용 장비가 목록에 있는 경우 팬 등 기계적 환기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국내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들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분리돼 있지 않다. 별도의 환기장치 없이 해당 층 전체의 소방 강제 환기 시스템으로만 설계돼 운영되고 있다.
화재폭발 사고가 보통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하는 데다가 한 번 불이 붙으면 전소될 때까지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환기설비의 설계가 중요하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6월 29일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발령한 후 시행하고 있다.
충전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해서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6)의 밖에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충전 공지7)는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둘 것’이라고 규정했다.
반대로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안에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가연성 증기가 남아 있을 우려가 없도록 별표 4 Ⅴ 제1호 다목에 따른 환기설비 또는 별표 4 Ⅵ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먼저 설치 이격거리에 관해 ‘폭발위험장소 외 범위’로 완화한 점에 대해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은 방폭설비설계 전문 지식을 갖춘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하는 고유의 업무다.
이는 가연성 물질 누출과 잠재적 점화원으로 인해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없으므로 해외 권장 사항과 규정에서 일부 완화된 방식으로 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 또 유럽이나 미국보다 좁은 면적에 여러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해야만 하는 국내의 환경 조건에 맞게 제시된 개정안이라고 본다.
국내의 환기설비와 배출설비에 대해 살펴보면 ‘환기는 자연배기,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배출설비(Ventilator) 또는 루프 팬(Roof-fan)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강제 배기방식의 배출설비를 설치하라’고만 규정돼 있다.
단순하게 이 규정으로만 적용될 경우 실제 가스가 누출되면 제대로 환기되지 않아 더 큰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실외에 설치되는 충전기도 그렇지만 특히 실내에 설치되는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고려할 경우 환기 설계에 크게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는 ‘환기’가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다. 하지만 이에 관한 설계 계산이 너무 미흡해 향후 보완이 절실하다.
3. 누출원에 따른 분류 누출원에 따른 분류 방법은 이미 해외에서 많은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다. 가연성 물질을 저장ㆍ취급함으로써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방폭설비 설계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누출원에 따른 방폭설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간이법보다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실제에 가까운 환기 방식 적용과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할 수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EC)의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한 표준인 60079-10-1에는 잠재적 폭발위험이 있는 누출원에 따른 분류 방법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개별 누출원에 대해선 ‘필요한 평가를 하는 게 비현실적인 경우 간이법(Simplified methods)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누출원에 따른 분류 방법을 국내에 적용하려고 지난 2018년 KGS GC8)101을 공표했다. 이 방법은 가연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주요 지점에서의 누출등급과 희석등급, 환기의 유효성 계산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장소를 구분 지었다.
KGS GC 101에는 계산이 복잡하게 이뤄지고 환기 조건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CFD)을 활용해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표만 했을 뿐 인허가나 공정안전관리(PSM) 등에 적극 적용토록 하는 정부 주도 차원의 움직임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거의 모든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 건축물 프로젝트는 개별 누출원이 아닌 단순화된 방법으로 폭발위험장소 구분 도면을 그려왔다. 이 역시 큰 규모의 대기업 석유화학이나 공정 플랜트 등에서만 일부 수행했을 뿐 중소 규모의 사업장은 도면조차 없이 준공 허가를 받았다.
아래 위험장소 구분 기준 표를 참고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환기 설계를 잘한다면 폭발위험장소를 비폭발위험장소로 충분히 변경시킬 수 있다.
규정 고도화로 예방 대책 갖춰야 인허가를 빨리 받기 위한 시급성과 사업주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 폭발위험장소 구분을 단순화된 방법(Simplified Methods)으로 진행하는 건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할뿐더러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원래 목적인 폭발사고 예방이 될 수 없다.
예전부터 계속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상세하지 않은 설계부터 바로잡아야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전기차 충전소 운영도 이뤄질 수 있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뿐 아니라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차 충전시설 또한 계속 증설될 예정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해서 높이고 규정의 고도화를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안전강국이 되길 소망해 본다.
1)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영국의 국가 화재 안전 조직으로 1946년 설립, 화재 안전의 모든 측면에 대한 독립적인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영국과 해외의 약 5천개 소방 관련 회사와 조직이 가입돼 있다. 2) Association for petroleum and explosives administration. 석유 산업 내에서 정보, 아이디어, 관행의 교환을 촉진하는 영국의 협회다. 3) Energy Institute. 에너지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와 기타 전문가를 위한 전문 조직이다. 2003년 석유 연구소와 에너지 연구소가 합병되면서 생겼다. 공익을 위한 모든 응용 분야에서 에너지와 연료 과학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자선단체로 약 2만명의 사람과 200개의 회사로 구성된다. 4) Design, construction, modification,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of filling stations(4th edition)를 의미한다. 아마도 표지가 파란색으로 디자인돼 Blue Book이라는 별칭으로 지칭되는 듯하다. 5)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과학과 공학, 기술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링 기관이다. 1871에 설립된 전기 기술자 협회 IEE(Institution of Electronics and Electrical Incorporated Engineers)와 1884년에 설립된 IIE(Institution of Incorporated Engineers) 등 두 개의 별도 기관이 2006년 결성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자선단체로 등록돼 주로 업계 표준 출판과 컨퍼런스 등을 개최한다. 6) 주유 또는 등유ㆍ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ㆍ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등 7) ‘충전기기의 주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지’를 뜻한다. 주유를 위한 자동차 출입 공지인 ‘주유 공지’는 너비 15m,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므로 ‘충전 공지’는 이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규모다. 8)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가스3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 등의 상세한 기준인 상세기준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다.
한양대학교_ 주윤환 : yunhwanjoo@hanyang.ac.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