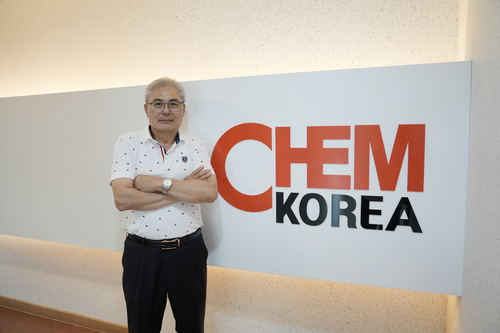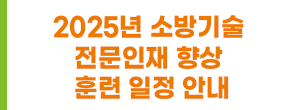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119기고] 이약동(李約東)… 그에게 ‘이 시대 청백리’를 묻다제주특별자치도에 청렴연수를 다녀와서…
그의 집안은 대대로 명문이었다. 할아버지(이존실)는 군기시소감을 지냈고, 아버지(이덕손)는 남해현령을 역임했다. 어머니는 공조판서를 지낸 유무(柳務)의 딸이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것 같다.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자식에게 투영되니 말이다. 이약동은 세종 23년(1441)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종 1년(1451) 정과(丁科)에 급제한 뒤 사섬시 직장(直長)을 거쳐 단종 2년(1454)에 감찰·황간현감 등 요직을 역임했다. 성종때 청백리로 뽑혔다. 이약동과 인연이 깊은 김종직의 시에는 그를 칭송하는 글귀들, 예를 들어 ‘백관 중에서도 가장 고루 덕이 뛰어나다’든가 ‘공은 시서(詩書)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참된 우두머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평생을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아오면서 재물을 멀리한 그의 신조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시다. 만년에는 김천의 고향집에 내려와 여생을 보냈는데 집은 겨우 비바람을 막을 만하였고 아침 저녁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또한 자손들에게 ‘돈을 보기를 흙같이 하라(견금여토)’를 대대로 지켜야 할 가훈으로 내려주었고 본인 스스로도 이 가훈을 철저히 지켰으며 실제로 수차례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어떤 물건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선정(善政)에 감사하는 뜻으로 올린 선물까지 마다하였다고 하니… 이쯤 되니 그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일화를 통해 그를 담아보고자 한다. 1470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였을 때의 일이다. 목사란 조선시대의 지방관으로서 관찰사 아래서 각 목을 다스리던 정삼품의 외직문관 벼슬로 행정적 기능 외에 군사적인 기능 수행까지 하는 제주도 전체를 총괄하는 기능을 겸하였기에 제주도의 책임자나 다름 없었다. 당시 제주도는 중죄인들이 귀양살이를 하는 멀리 떨어진 섬에 불과했다. 지금처럼 농사가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자가 항상 부족하여 백성들이 굶주리는 일이 잦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속(각 관아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보던 사람)들이 중간에서 공물을 가로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 있었다. 이런 때에 이약동이 제주도에 부임한 것이다. 부임 후 제일 처음 한 일은 각종 공물과 세금에 관한 문서들을 검토하는 것.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이속들이 상당한 양을 중간에서 착복한 것이 드러났고… “받아들인 공물이 다 어디로 간 것이냐? 중간에서 누군가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양이 사라질 리 없다.” “횡령이라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쥐가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쥐가 들끓어 곡식이 없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늘 있는 일이지요.” 이속들은 쥐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부인했다. 이약동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구운 소금 거둬들인 것 없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것도 역시 쥐가 먹어 없어진 것이냐?” “그렇지요. 쥐가 많아 없어지는 양이 상당합니다. 매해 있는 일인데 쥐라는 것이 잡기가 어려워 없애기가 힘듭니다.” 이속들이 다시 쥐 핑계를 대자 이약동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쥐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많은 소금이 없어지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쥐가 필요하며 얼마나 큰 쥐가 필요한 것이냐? 이 쥐들은 필경 너희들이렸다!” 그러면서 이속들의 입에 소금 한 바가지씩을 부어 넣었다. “어디 한 번 또 먹어보아라. 너희 같은 큰 쥐들이 한 바가지도 먹지 못하는데 작은 쥐들이 도대체 얼마나 먹을 수 있단 말이냐? 먹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알고 크게 벌을 내릴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소금을 먹지 못했고 큰 벌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로 제주도에서는 소금은 물론 다른 공물과 세금을 중간에서 횡령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약동이 제주를 떠나 육지로 향할 때였다. 항해 중에 갑자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 배가 빙빙 돌면서 움직이지 않아 사공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벌벌 떨고만 있었고 이약동이 수하 관리에게 물었다. “나는 이 섬에 와서 한 가지라도 사리사욕을 취한 것이 없다. 우리 중 누군가가 부정을 저질러 신명이 노한 것이 아닌가. 일행 중 누구라도 섬의 물건을 챙겨온 자가 있으면 내놓아라.” 비장이 우물쭈물 말을 했다. “백성들이 목사님을 위해 바친 금갑옷을 실어두었습니다. 나중에 갑옷을 입으실 때 드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그만….” 이에 이약동은 “그 정성은 내가 잘 알았으니 이제 갑옷을 바다에 던져라”했다. 갑옷을 바다에 던지자 즉시 파도가 그쳤고 곧 배가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갑옷을 던졌던 곳을 ‘투갑연(投甲淵 : 갑옷을 던진 물목)’ 이라고 한다. 제주도 백성들은 이러한 이약동의 선정(善政)에 감동해 송덕비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이약동은 이를 마다하며 일체의 선물도 받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은 말채찍 하나를 만들어 바쳤고 이약동은 이것만은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어 사냥을 나갈 때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항상 사용하였다고 한다.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날 때, 재임 중에 착용했던 의복이나 사용하던 기물은 모두 관아에 남겨두고 떠났는데 한참 동안 말을 타고 가다보니 손에 든 말채찍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것은 백성들이 제주목사에게 바친 것이니 후임 제주목사가 써야 한다”며 즉시 채찍을 성루 위에 걸어두고 가던 길을 갔다고 한다. 그 후 후임자들은 채찍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걸어놓고 모범으로 삼았다. 세월이 지나 그 채찍이 썩어 없어지자 백성들은 바위에 채찍 모양을 새겨두고 기념했는데 그 바위를 괘편암(掛鞭岩)이라 했다. 청렴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듯 이약동은 청렴을 기본으로 부패를 근절하여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느껴진다. 또한 한라산산신제를 산천단에서 행하게 함으로써 도민들이 산신제를 지내면서 동사하는 폐단을 시정하기도 하였다. 김천 하로의 고향집에 내려와 살던 이약동이 후손들에게 유훈으로 남긴 시가 있다. ‘살림이 가난하여 나누어 줄 것은 없고/있는 것은 오직 낡은 표주박과 질그릇일세/ 주옥이 상자에 가득해도 곧 없어질 수 있으니/후손에게 청백하기를 당부하는 것만 못하네.’ 이약동의 시비를 보고 있노라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 아니었나 싶다. ‘청렴은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사람은 모두 청렴하게 태어나고 청렴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 자라면서 부패를 학습하게 되지만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의해 청렴한 행동을 할 본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청렴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양심이며 동시에 미래를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의 바람이 내 마음의 온도를 1℃ 높여주고 있었다. 서울은평소방서 소방장 최선미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평소방서 홍보담당입니다. 우리 은평소방서는 24시간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동분서주 은평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은평소방서의 소방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평소방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