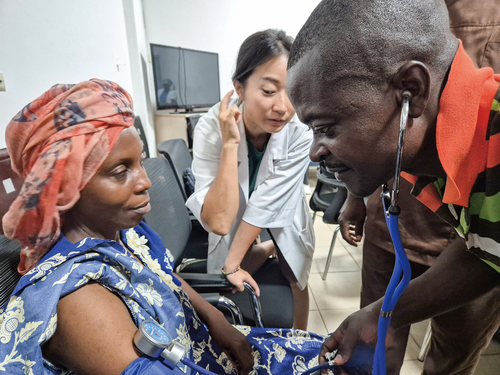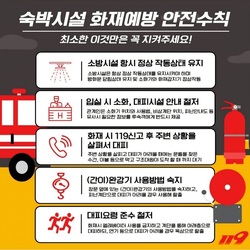김흥환 소방위 “배터리 화재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 대응 체계 있어야”배터리 정보공유, 무인ㆍ고성능 대응 장비 배치 필요성 주장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산업교육연구소에서 ‘ESSㆍ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위험성과 현장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흥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위는 “국제적 기준에서 리튬이온배터리 등 이차전지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닌 복합재난(Hazmat)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방에서만 대처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방위에 따르면 이차전지에서 불이 나면 불화수소(HF)가 발생한다. 불화수소는 사람뿐 아니라 동ㆍ식물에게도 치명적인 화학물질로 오랜 시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해엔 독일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2명이 레벨 A 화학보호복을 착용하고도 불화수소에 노출돼 병원에 이송됐다. 이차전지 화재 현장에 있는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셈이다.
이어 “ESS나 전기차는 완제품으로 제품별 불화수소 누출량을 알려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이 있어야 한다”며 “소방 한 조직에서 일률적인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국외에선 소방서별로 편성된 특수재난 전담부서(Hazmat Team)가 이차전지 화재를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 화재진압 대원이 투입된다”며 “특수재난 현장대응 전문가의 지속적인 육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많이 거론되는 이차전지 소화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소방위는 “NFPA의 ESS 화재진압 기준을 보면 물이나 포로 소화하라고 돼 있다”며 “하지만 주수를 통한 냉각 소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온엔 포 소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식소화덮개는 배터리 내부에 산소가 있어 차단해도 소화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수조는 지하주차장에선 사용하기 힘들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선 원거리 분무 주수가 가능한 특수화학 소방차량 등 무인ㆍ고성능 장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최적의 진압 전술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김 소방위 외에도 ▲대형 배터리 화재 사고를 겪은 한국 ESS 산업의 나아갈 길(박철완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Data Science를 통한 ESSㆍ전기차 배터리 실시간 상태진단(한세경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부교수) ▲국내외 ESS 화재 예방기술ㆍ화재를 통해 배우는 예방 전략(이주광 (주)티팩토리 전무이사)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