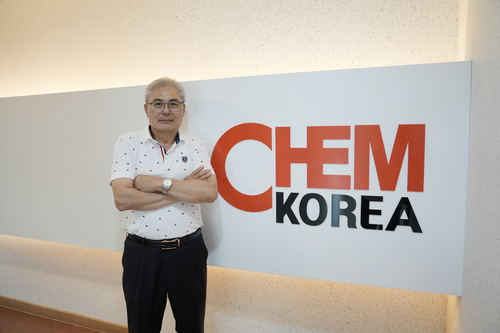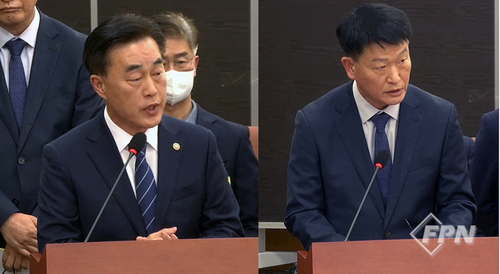최근 해루질 사고가 이어지면서 갯벌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인천 옹진군 갯벌에서는 해루질에 나선 70대 외국인을 구조하던 해양경찰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며칠 전에는 당진과 전북 변산 앞바다에서도 해루질 중 고립 사고가 보도됐다. 해루질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지만 순간의 판단 착오가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갯벌 고립 사고는 약 288건 발생했고 이 중 3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확인된다. 인천 지역 언론 보도에서는 최근 3년간 약 75건의 갯벌 고립 사고가 있었고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의 절반 이상은 야간ㆍ단독 해루질 상황에서 발생했다.
해루질은 간조 시간대에 조개나 게 등을 채취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사고 사례를 보면 몇 가지 공통된 위험 요인이 있다.
첫째, 물때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서해안 갯벌은 물이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퇴로가 순식간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어둠 속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셋째, 혼자 나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요청이 늦어진다.
넷째, 구명조끼, 휴대용 조명, 위치추적 장치 없이 활동하면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된다.
갯벌에서 안전을 지키려면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 제도적ㆍ현장 대응과 정보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첫째, 위험지역 출입 제한이다. 사고 다발 지역에는 야간 출입 제한과 경보 장치, 경고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다. 구명조끼와 조명, 위치추적 장치 사용을 단순 권고에서 행정적 의무로 전환하고 대여 체계를 마련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실시간 정보 제공이다. 물때ㆍ기상 정보, 위험 알림을 해경과 지자체가 통합해 관광객과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한다.
넷째, 순찰ㆍ감시망 강화다. 드론과 CCTV, 순찰선 등 다양한 감시 수단을 활용해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 교육ㆍ홍보 캠페인이다.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절별 안전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해루질은 바다와 교감하는 소중한 문화다. 그러나 반복되는 인명피해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결과다. 제도적 안전 장치와 실시간 정보,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추고 해루질에 나서는 개인도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 소방위 김동석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