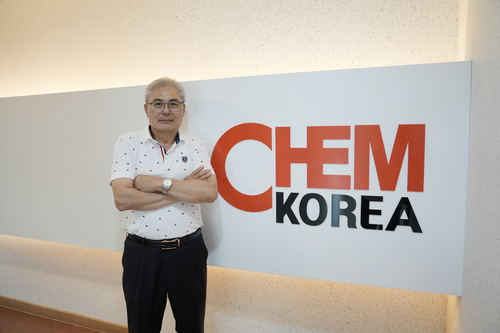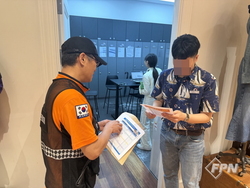‘위험도 = 화재 발생 가능성 × 화재 후 피해 규모’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화재 후 피해 규모 즉 피해심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피해심도는 화재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정도를 의미한다. 화재 발생 후 대응력 등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한다. 주요 변수론 초기대응능력을 비롯해 소화설비, 지역 공공소방대, 건물 자체의 내화성능이 해당한다.
화재는 초기에 진압할수록 피해 규모가 작아지고 대응 시간이 지연될수록 커지게 된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모든 대응에 실패하고 오로지 건물의 내화성능에만 의존할 경우다.
그렇다면 화재 발생 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화재 초기 대응에 성공하거나 대응 실패로 인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 중 하나가 될 거다. 결국은 단계별 대응에 대한 성공과 실패 확률을 정량적인 값으로 산출해야 한다. 목적에 따라 확률로 산출하거나 점수화해 산출하게 된다.
단계별 대응 능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의 초기대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했다면 초기대응에 성공해 피해심도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 단계의 소화설비와 공공소방대 등의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면 초기대응 실패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패 후 피해심도는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심도는 가중치를 부여한 단계별 대응 능력의 평균값이 실제 사업장의 화재 후 대응력에 대한 정량적인 값이 될 거다.
그림 1은 화재 발생 후 단계별 대응력을 평가해 성공과 실패 확률로 변환한 뒤 다양한 사고결과를 확률로 분석한 예다. 사고결과 등급 G1~G5는 사고결과를 정의한 것이며 열가지 발생빈도를 모두 더하면 화재 발생 확률인 0.0141건/연간과 같다.
이런 확률값을 이용한 ETA분석은 화재 시 예상피해금액으로 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위험을 낮추기 위한 투자비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해 합리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선 사고 결과 등급 G1~G5에 해당하는 피해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표 1은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고 결과 등급 산정을 위한 기준 예시다.
각각의 사고 결과 등급 발생빈도에 피해 금액을 곱한 후 모두 더한 값이 화재로 인한 연간잠재손실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에는 예시를 통해 연간잠재손실비용을 산출해보도록 하겠다.
여용주 국가화재평가원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