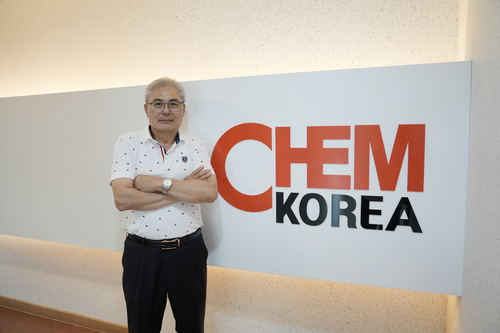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고 아버지가 크게 다쳤다. 화재 원인은 배터리 폭발. 개인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배터리에서 발화됐다. 이틀 후인 같은달 19일 발생한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 화재도 캠핑용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총 678건이다. 2020년 98, 2021년 106, 2022년 178, 2023년 179, 2024년 1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25㎞에 달한다.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 20만대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30년이 되면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 소방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리튬이온 배터리(LIB, Lithium-ion Battery)는 가볍고 부피에 비해 충전용량이 커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 작은 셀(Cell)로도 전압설계가 가능해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
그러나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과 과방전, 과전류 시 폭발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미 일상에 많이 침투한 만큼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열폭주가 동반된다. 이럴 경우 물이나 강화액 등 일반 소화약제로는 진압할 수 없다. 꺼졌더라도 재발화한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EcoNova-K(ENK) 명칭의 침윤소화약제는 소형배터리 화재 적응성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제품(제 CDSP 2023-41-1)’ 인증도 받았다. 배터리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가 있다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 소화약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간이소화용구로 형식승인한 제품에도 사용됐다. 그러나 소화기가 아닌 ‘간이소화용구’라는 이유로 일반 소화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소화기의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소화 성능의 KFI 인증기준’을 제정했다. 하지만 배터리 소화기에 대한 KFI 인증은 하지 않는 실정이다. 공동주택과 비행기, 공장 등 여러 곳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전용 소화기 성능인증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40~70kWh 이상의 모듈형이다. 이곳에서 불이 나면 약제 침투가 어려워 화재진압이 힘들다. 개인 이동장치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 1kWh 이하다.
이는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침윤소화약제로도 초기 진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침윤소화약제는 표면장력이 낮아 셀 사이로의 침투력이 높고 냉각 효과가 매우 크다. 친환경 약제로 불소가 나오지 않는 특성도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소화약제가 하루빨리 국내기준으로 성능이 인증돼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청을 비롯한 소방 관련 기관이 나서야 한다.
최규출 (사)국가안전환경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