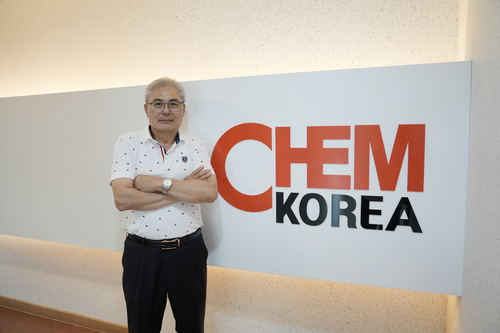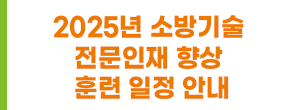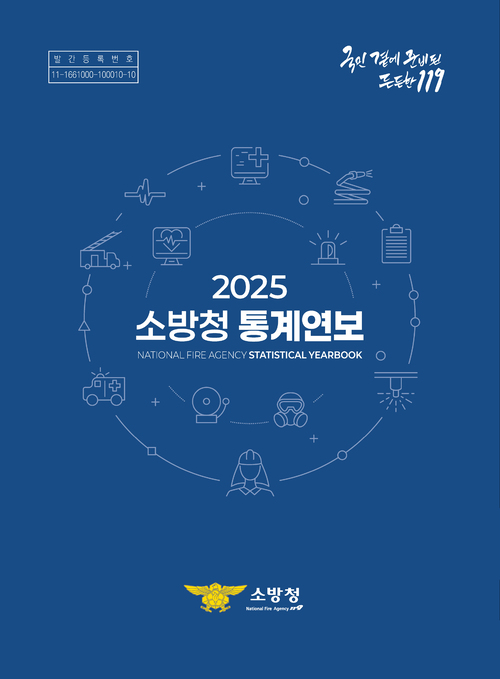특별구급대, OHCA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병원 밖 심정지(OHCA)는 주요 공중 보건 문제다. OHCA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OHCA 이후 전체 생존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서비스 종사자는 생존 사슬에서 OHCA 환자를 처음 대면한다. 따라서 출동ㆍ구급대원이 최적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게 OHCA 결과 개선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병원 전 처치 90%를 담당하는 ‘119구급대’ 소방은 국내에서 10만210㎢에 걸쳐 약 5천만명의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EMS 시스템을 운영한다. 2020년 기준 전국 18개 시도본부와 226개 소방서가 있고 소속지역 구급대가 있다.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EMT)와 간호사로 구성된다. EMT는 교육ㆍ경험에 따라 1ㆍ2급으로 분류되고 간호사는 대학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들이다.
간호사와 1ㆍ2급 EMT는 현장과 이송 중 가슴 압박, 제세동과 같은 BLS(Basic life support)를 제공한다. 특히 1급 EMT, 간호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 감독하에 전문기도관리, IV(intravenous injection, 정맥내주사) 적용과 같은 ACLS(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2015년 소방은 구급차 2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대응체계인 다중출동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OHCA가 의심되면 두 대의 구급차가 동시 출동해 4~6명의 구급대원이 함께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덕분에 OHCA 생존 결과가 개선됐다.
그러나 이후 생존율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소방청은 2019년 더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EMS 종사자가 OHCA 결과를 개선한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OHCA에서 업무범위 확대 구급대인 ‘전담 OHCA 팀’으로 활동할 특별구급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소방은 병원 전 ACLS를 위한 3일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훈련 프로그램은 OHCA, 심근경색, 중증 외상 등 주요 응급상황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참여했으며 2020년까지 모든 구급대원의 ¼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급대원은 OHCA 팀, 즉 특별구급대로 지정하고 각 소방서 구급대에 배치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정된 특별구급대에서 근무하는 1급 EMT는 이전엔 수행할 수 없던 OHCA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었다.
특별구급대 어떤 성과가 있었나? 특별구급대 운영 이후 OHCA 환자의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2020년 한 해 동안 OHCA로 119구급대 치료를 받은 모든 성인 환자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 기간 중 구급대에 의해 치료된 3만1651명 중 2만3512명의 적격 환자가 연구 모집단에 포함됐다.
OHCA나 심근경색 등 주요 응급상황에만 전담팀이 출동했고 나머지는 주요 응급상황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응급상황에 비전담팀이 출동했다. 비교는 전담(특별구급대 A, B형), 비전담(특별구급대 C형), 기본(일반구급대)팀으로 나눴다([그림 1] 참조).
2만3512명의 OHCA 적격 환자 중 1만2874명(54.8%)은 기본팀에서 치료받았고 8580명(36.5%)은 비전담팀, 2058명(8.8%)은 전담팀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 전 ROSC(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자발순환회복)는 기본팀보다 지정팀에서 더 높게 나왔다(전담팀 13.8, 비전담팀 11.3, 기본팀 6.7%, [표 2] 참조).
전체 연구 인구의 87%에 병원 전 전문기도관리가 적용됐다. 전담팀 90.7, 비전담팀 90.5, 기본팀 84.1%로 지정팀 모두 전문기도관리 제공률이 높았다.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기도관리 적용까지의 중앙값 간격은 지정팀보다 기본팀이 짧았다. 지정팀은 ETI(endotracheal intubation, 기관내삽관) 제공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ETI 적용까지의 간격은 기본팀보다 길었다.
지정팀은 IV 적용 제공 비율이 더 높았다. 단 IV 적용까지의 간격은 기본팀보다 길었다. IV 에피네프린은 지정팀이 기본팀보다 에피네프린을 더 많이 투여했다. 구급대 도착부터 에피네프린 투여까지의 간격은 세 그룹에서 유사했다.
연구 결과 특별구급대의 병원 전 ROSC가 더 높았고 지정팀은 전문기도관리, IV 적용, 에피네프린과 같은 병원 전 ACLS 개입을 더 많이 제공했다.
또 지정팀 중 주요 응급상황에만 출동된 전담지정팀은 모든 응급상황에 출동된 비전담지정팀보다 병원 전 ROSC가 높았고 병원 전 ACLS 중재를 더 많이 제공했다. 그러나 병원 전 ACLS 제공 시점을 보면 지정된 팀이 현장의 기본 팀보다 빨리 ACLS를 제공하진 않았다.
구급대원 운영ㆍ능력은 OHCA 결과와 관련이 있다. 구급대원이 더 훈련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ACLS 제공률과 생존율이 높아진다. 특별구급대 운영은 지정된 팀의 경험을 향상시켰고 OHCA 환자의 생존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모든 팀이 동일한 장비를 갖고 있었는데도 지정된 단위 대응에서 병원 전 ROSC 비율이 더 높았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줬다.
지정팀을 주요 응급상황에만 출동하는지 또는 모든 응급상황에 출동하는지에 따라 분류했을 때 전담팀이 비전담팀보다 병원 전 ROSC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팀은 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EMS 운영방법이 환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급차 대응 유형이 병원 전 ROSC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해 구급차 대응 유형별로 병원 전 ACLS 중재 제공률을 조사했다.
병원 전 ACLS가 OHCA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이 있다.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기도 관리, IV 에피네프린과 같은 병원 전 ACLS는 고품질 BLS보다 덜 중요하다는 게 일반화됐다.
중요한 건 ACLS 제공이 아니라 ACLS의 시기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지정팀은 고품질의 병원 전 전문기도관리와 IV 적용을 제공했다. 그러나 구급대가 현장 도착 후 ACLS를 제공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신고부터 구급대 현장 도착시간 간격과 관계없이 기본팀보다 길었다.
아직 정확한 이유를 알긴 어렵지만 지정팀은 기본팀보다 현장 체류 시간 간격이 훨씬 더 길었다.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특별구급대원들은 ACLS를 계속 시도하며 현장에 오래 머물렀고 ETI 제공 등 더 많은 ACLS에 개입했던 게 시간이 길었던 이유일 거로 추측된다.
우리나라는 다중출동 대응과 같은 다양한 EMS 개입을 적용해 OHCA 결과를 지속해서 개선했다. 국가마다 고유한 EMS 시스템이 있으며 EMS 담당자의 역할도 다르다. 최적의 EMS 구성과 구급대원의 역할은 다양한 EMS 시스템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구급대원에게 병원 전 ACLS 개입을 조기에 제공하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청 구급의학연구 TF_ 이승효 : emt0327@gmail.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