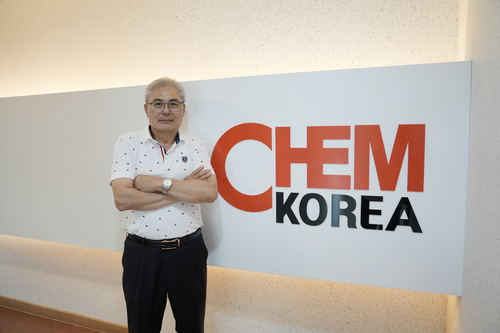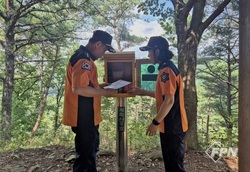매년 주거시설에서 1만건 이상 불이 난다. 이 화재로 1100명이 죽거나 다친다.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2023년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층에 거주하던 30대 아버지는 어린 딸을 안고 지상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 사례는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일반 주민의 대응 역량이 생명과 직결됨을 보여준다.
2020년 12월 1일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의 아파트 화재도 문제였다.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을 옥상 출입문으로 착각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비상 대피 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과 혼란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반면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주상복합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3층 테라스에서 최초 발생해 불길이 최상층까지 도달했는데도 93명의 주민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전원 구조됐다.
특히 피난층(28층)과 옥상으로의 대피 유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졌고 구조대가 해당 피난 공간에 신속히 진입해 구조에 성공했다. 이는 피난 공간의 역할과 주민의 행동요령 숙지가 피해 최소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다. 소방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명확한 화재 대비의 원칙과 맞닿아 있다.
소방시설은 설치된 것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주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목적을 달성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은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점검도 이뤄진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대부분 건물 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국한돼 실제 거주자의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인이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례가 많이 증가한 것처럼 교육과 제도가 잘 갖춰지면 화재에 대한 시민의 대응력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젠 소방시설 설치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사용법과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초기 대응이 가능한 안전 공동체를 구축하고 골든타임 내 생명 구조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정훈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