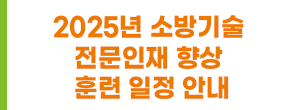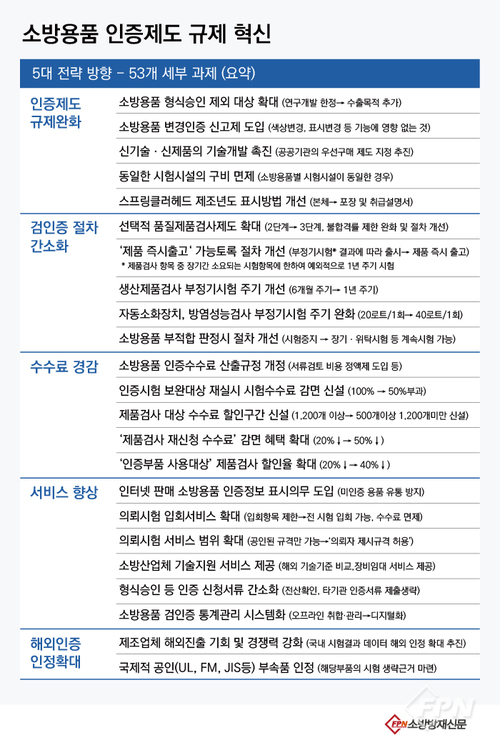|
13. 무인항공기의 역사(1900~1910년대) 1989년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 1856~1943)는 전자기파를 활용한 무선 조종 기술(텔 오토매틱스, Tel automatics)을 통해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 하지만 아직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항공기를 개발할 수준까진 아니었다. 당시 유인항공기 연구 개발이 이렇다 할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 역사적인 항공기 ‘플라이어’가 탄생하게 된다. 이전까지 개발된 항공기는 비행 제어가 어려웠지만 ‘플라이어’는 사람이 탑승해 직접 비행을 제어할 수 있는 최초의 유인항공기였다. 이후 항공기의 연구 개발은 무인항공기보다 사람이 직접 탑승해 조종하는 유인 방식이 대세가 된다.
당시 무인항공기 개발은 현실적이지 못했다. 설령 전자기파를 활용한 장거리 무선 조종이 가능하다 해도 멀리 떨어질 때 보이지 않거나 보이더라도 비행 방향이나 속도, 자세, 연료량 등 상태를 자세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비행을 시도한다 해도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거의 눈 감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비행하는 유인과 무인 방식 모두 조종사가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연구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사람이 직접 탑승해 조종하는 유인항공기 개발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었다.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를 개발한 이후 유인항공기 개발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그런데도 일부 선구자는 무인항공기에 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유인항공기 비행 기술이 점차 발전할수록 비행성이 이미 검증된 유인항공기를 개량해 무인항공기 개발을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인 조종으로 비행할 방안을 찾는 데만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14년 무인항공기 개발 선구자 엘머 스페리(Elmer Sperry, 1860~1930)는 자율 항행 방식의 스페리 자이로 스테빌라이저(Sperry Gyro Stabilizer)를 개발해 조종간을 놓고 비행하는 방식에 성공한다.
자율 항행 방식은 다른 외부의 지배나 구속 없이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원칙에 따라 비행하는 방식이다. 엘머 스페리가 1909년에 먼저 개발한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자이로스코프는 물체가 빠르게 회전할 때 자세를 유지하려는 힘을 이용한 안정화 장치로 선박 항해 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나침반 용도로 먼저 쓰였다.
엘머 스페리는 1910년 설립된 스페리 자이로스코프 컴퍼니의 창시자로 현대 내비게이션 기술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구자였다.
이후 자이로스코프는 항공기 분야뿐 아니라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 잠수함과 우주선, 미사일 등의 개발에도 쓰이게 된다.
엘머 스페리는 자이로 스테빌라이저의 자율 항행 기술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조종사가 없는 무인 비행 폭탄을 구현한다.
엘머 스페리와 피터 휴이트(peter Hewitt, 1961~1921)가 공동 연구한 에어리얼 토페도(Aerial Torpedo)가 바로 그 첫 번째 주인공이다.
피터 휴이트는 1901년 형광등의 전신인 최초의 수은 증기 램프와 아크 정류기를 발명한 미국의 전기 엔지니어다. 사교 모임에서 니콜라 테슬라에게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선통신제어 장치에 관한 관심을 두게 됐다. 그 후 엘머 스페리와 함께 무인항공기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1917년 9월에는 투석기를 이용해 이륙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이후에도 실험이 지속됐지만 1918년 11월 11일 미 해군은 제1차 세계대전 휴전 협상을 이유로 에어리얼 토페도의 개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한다.
비슷한 시기 미 육군에서는 미 해군의 공중어뢰 프로젝트인 스페리 에어리얼 토페도의 군사적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1917년 11월 4인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위원 세 명은 스페리 에어리얼 토페도가 아직 군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단 한 명인 찰스 케터링(Charles Kettering, 1876~1958)만 “조종사가 없는 무인항공기가 잠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권고했고 결국 받아들여져 미 육군에서도 극비리에 무인항공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미 육군의 요청사항은 40mile 범위의 목표를 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인 비행 폭탄(플라잉 머신) 개발이었다. 이 무인 비행 폭탄은 케터링 버그(Kettering Bug)로 명명하고 찰스 케터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때 개발자 중 오빌 라이트가 항공컨설턴트, 미 해군의 공중어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엠머 스페리가 제어ㆍ항법 시스템 설계자로 참여한다.
케터링 버그는 무인 비행 폭탄인 만큼 180lb(약 82㎏)의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물을 확실히 명중시키기 위해 풍속 등 공기와 관련된 이동 거리, 방향에 대한 오차를 계산했다. 항공기의 비행거리를 추적하는 기계 시스템(현대의 순항 미사일)도 고안됐다.
비행거리를 추적하는 비행 기계 시스템은 케터링 버그가 이륙 후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계산된 총 필요한 엔진 회전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엔진을 끄고 날개가 분리돼 목표물을 향한 탄도 궤적을 그리게 되는 방식이다.
1918년 10월 케터링 버그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투석기를 사용하며 이륙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 완성된다. 이후 18번의 초기 테스트 중 7번을 성공하지만 확률이 많이 떨어져 실제 전투에 사용되지 못했다.
케터링 버그는 1918년 11월 11일 휴전 협상이 될 때까지 총 45대 생산됐다. 하지만 1920년 3월까지 실험한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참조 Unmanned Aviation(A Brief History of Unmanned Aerial Vehicles) THE AIRCRAFT BOOK 비행기 대 백과사전 en.wikipedia.org/wiki/Hewitt-Sperry_Automatic_Airplane flyingmachines.ru/Site2/Crafts/Craft29033.htm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 hcs119@seoul.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공기 역사와 드론의 정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